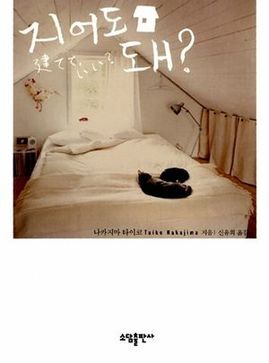2009/12/12 09:21
... 멀미가 날 것 같아서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가 위를 달리는 간선도로에서 내려다보니, 옛날에는 신흥주택지였을 지역이 펼쳐져 있다. 지금은 녹색도 적고, 집이나 아파트 같은 집합주택이 복작거리고 있어서, 그림물감을 전부 섞어놓은 듯한 무어라 말하기 어려운 색.
"괜찮아요?"
예에,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냥……, 좋구나 생각되는 집이 없다 싶어서요."
저마다 사연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본가도 그 나름으로 심혈을 기울여 지었고, 추억도 애착도 있다. 하지만 '좋은 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한다.
"이렇게 한눈에 봐서 아름답지도 않고 개성도 없다는 건, 역시 한 채 한 채가 좋지 않다는 거겠죠?"
후쿠시마 씨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전후에 생겨난 바라크(baraque, 막사 幕舍_옮긴이) 문화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은 없지만 역시 집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2, 30년이면 지저분해지는 싼 가격의 바라크를 사게 된다. '좋은 집' 보다 잘 팔리니까 잇달아 싼 집을 짓는다. 오래되면 부수고, 다시 새로운 바라크를 짓는다. 그러한 일이 되풀이해서는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리 없다. 운 좋게 돈이 있다 해도, 그런 거리에서 성장하면 무엇이 '좋은 집'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초호화 바라크를 짓고 말 때도 있다. 이 얼마나 변변찮은 나라인지. 그런 나라에서, 나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예산으로 집을 지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나부터가 '좋은 집'이 어떤지 모르고 있다. ...
"지어도 돼?" 중에서, [지어도 돼?], 나카지마 타이코, 신유희 옮김, 소담출판사, 2009
단편 2개를 묶은 책. 표제작인 "지어도 돼?"는 30대 중반의 주인공이 자신이 살고자하는 집을 짓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세밀한 논픽션 같은 보고서 형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 대한 감상을 늘어 놓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시장에 갔더니 입주 예정자 란에 독신은 아예 없는 에피소드나 마리가 처음에 원한 집이 "현관문을 열면 바로 욕실인 집"이었던 점 등 재미있는 부분도 많지만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집을 짓는 꿈을 꿀 수 있구나!"하는 부러움이었어요. 물론 주인공 마리도 부모님이 양도해준 교외의 땅이 있고 일반 사원급 직장인은 아니라서 집을 짓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런 상황이 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접한 건축사무소를 그린 만화나 일본 드라마나 소설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설정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창을 고르러 가서는 싼 일제를 할까 비싼 미제를 할까 고민하는 장면을 보면 마리 역시 넉넉한 형편에서 집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마리 정도의 재력이나 상황이 되는 사람이 미혼이든 독신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하고 물어보면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 같았거든요. 함께 실려있는 "그가 보낸 택배" 역시 귀여운 면이 있어서, 앞으로 나카지마 타이코 책이 또 눈에 띄면 읽어볼 것 같네요. 아래는 역시 "지어도 돼"의 앞부분에 마리가 깁스를 하고 커피숍에 있다가 느낀 점을 짧게 묘사한 부분인데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 역시 옮겨적어 봅니다. 이때는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이에요.
... 파트너가 있으면 몸이 멀쩡해도 쟁반을 정리해준다.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둘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건 부럽다. 혼자 살다 보니 내가 움직이지 않고선 일이 진척되질 않는다. 때문에 커피를 다 마시면 바로 쟁반을 치우고,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향하게 된다. 갖고 싶지도 않은 머그컵을 멍하니 보고 있을 시간 따위 주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여유를 갖는 것조차 잊기 십상이다. ...
p.s. 번역본과 원서 표지~ 참고로 마리는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