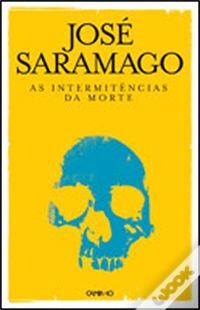2010/04/28 22:22
... 어느 날, 얼마 전에 과부가 된 한 부인은, 비록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렇게 애달파 하며 떠나보냈던 남편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새로운 기쁨을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 식당 너머 꽃으로 꾸민 발코니에 국기를 내다 걸 생각을 했다. 이 일은, 흔히 하는 말대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자 마흔여덟 시간이 안 되어 국기 게양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국기의 색깔과 상징이 풍경을 장악해 버렸다. 물론 이 점은 도시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도시에 발코니와 창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애국적 열광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스럽기는 한 이런 말까지 나도는 판이었으니 말이다. 불멸의 국기를 창문에 걸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 국기를 걸지 않는 사람은 배반을 하고 죽음으로 넘어간 거다, 우리와 함께 하자, 애국자가 되자, 깃발을 사자, 하나 더 사자, 하나 더, 생명의 적들을 타도하라, 적들아, 이제 죽음이 없으니 운이 좋은 줄 알아라, 거리는 깃발이 펄럭이는 축제를 방불케 했다. 깃발은 바람이 불면 펄럭였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심하게 설치해 놓은 전기 선풍기가 자기 몫을 했다. 선풍기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국기가 힘차게 펄럭이며 채찍질하는 듯한 소리를 내 군인 정신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래도 애국적인 색깔들이 영광스럽게 물결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면, 이건 지나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조만간 그 깃발과 페넌트를 모두 없앨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수군거리곤 했다.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입맛을 버리고 소화도 잘 안되듯이, 애국의 상징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이고 예의 바른 존중도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악용되면 결국 조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바바리코트를 입고 다니는 뻔뻔스러운 노출광과 다를 것이 뭐냐는 것이었다. 게다가 죽음이 더는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념하려고 깃발을 건 것이라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가적 상징이 너무 지겨워져 혐오감을 느끼기 전에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여생, 그러니까, 영원, 그래, 영원토록 국기가 비에 젖어 썩거나 바람에 누더기가 되거나 햇빛에 바랠 때 마다 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 가엾은 사람은 그런 비애국적 흥분 상태를 드러내는 바람에 몰매를 맞고 말았는데, 만일 이해 초에 죽음이 이 나라에서 업무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이 가엾은 사람의 목숨은 그때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났을 것이다. ...
[죽음의 중지] 중에서, 주제 사라마구, 정영목 옮김, 해냄, 2009
중간 이후에 갑작스런 설정이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쨌거나 만약 아무도 죽지 않는 다면(죽음이 업무 수행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에 대해 상상이 될만한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위에 밑줄도 죽음이 사라진 사실을 기뻐하면서 벌어진 일 중의 한 대목이구요. 호불호가 갈릴만한 작품이지만 사라마구의 소설들은 읽고 나면 항상 생각할 꺼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늘 기꺼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
p.s. 2005년 작품이니 작가의 나이 84세때 발표한 소설입니다. ^^;;;
p.s. 번역본과 원서, 다른언어 출간본 표지